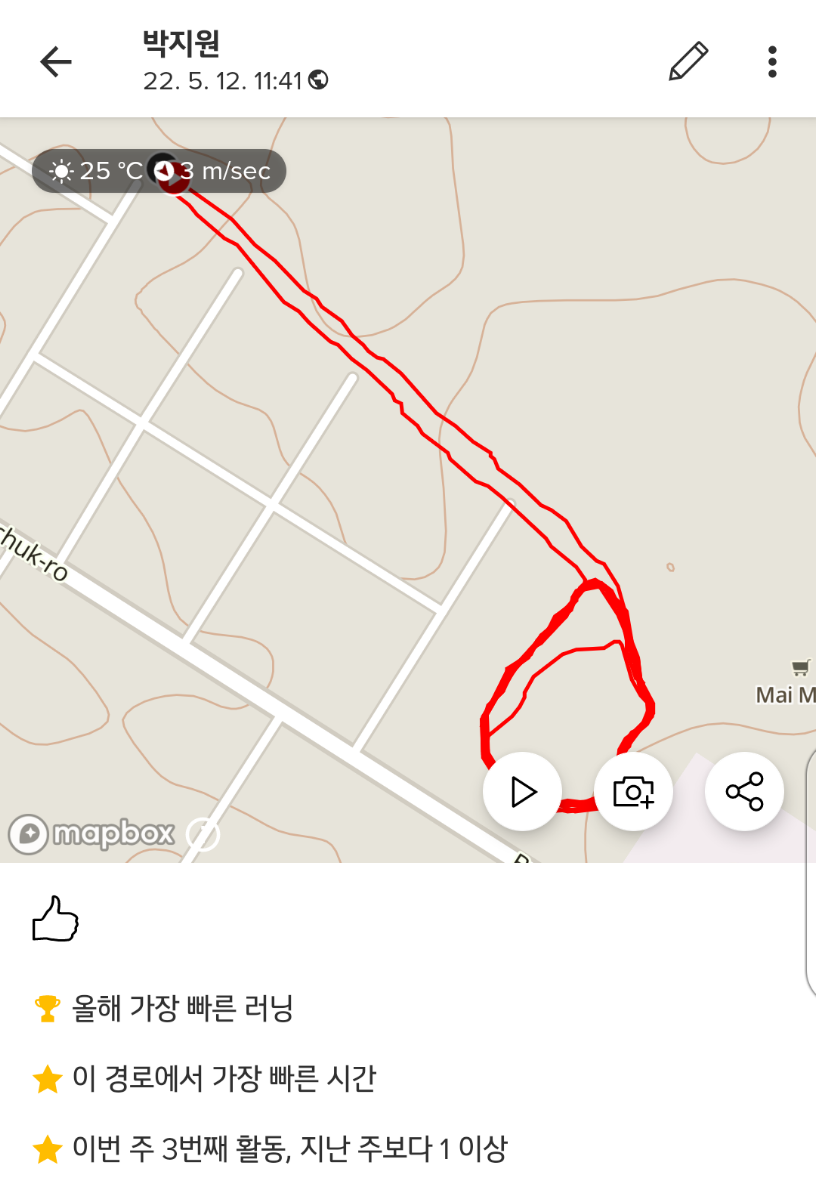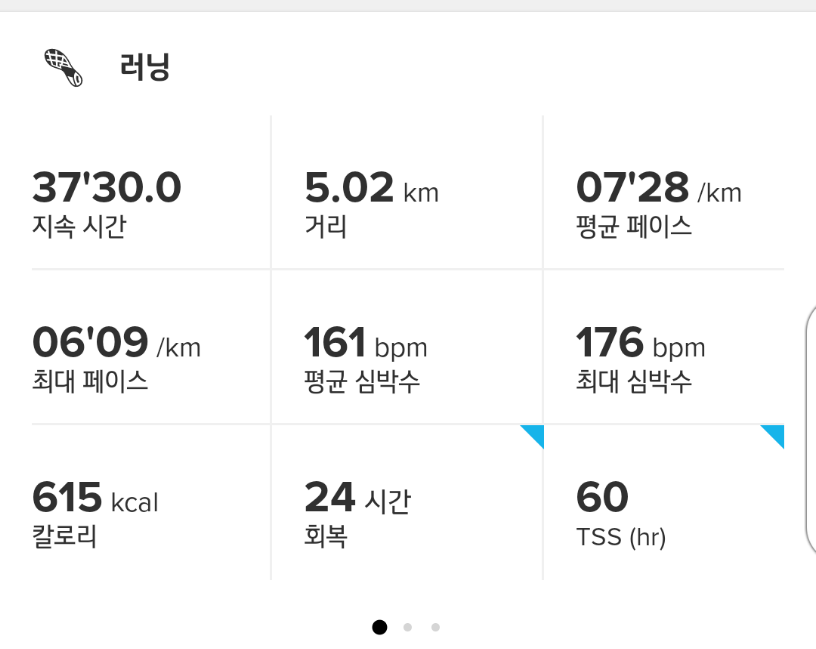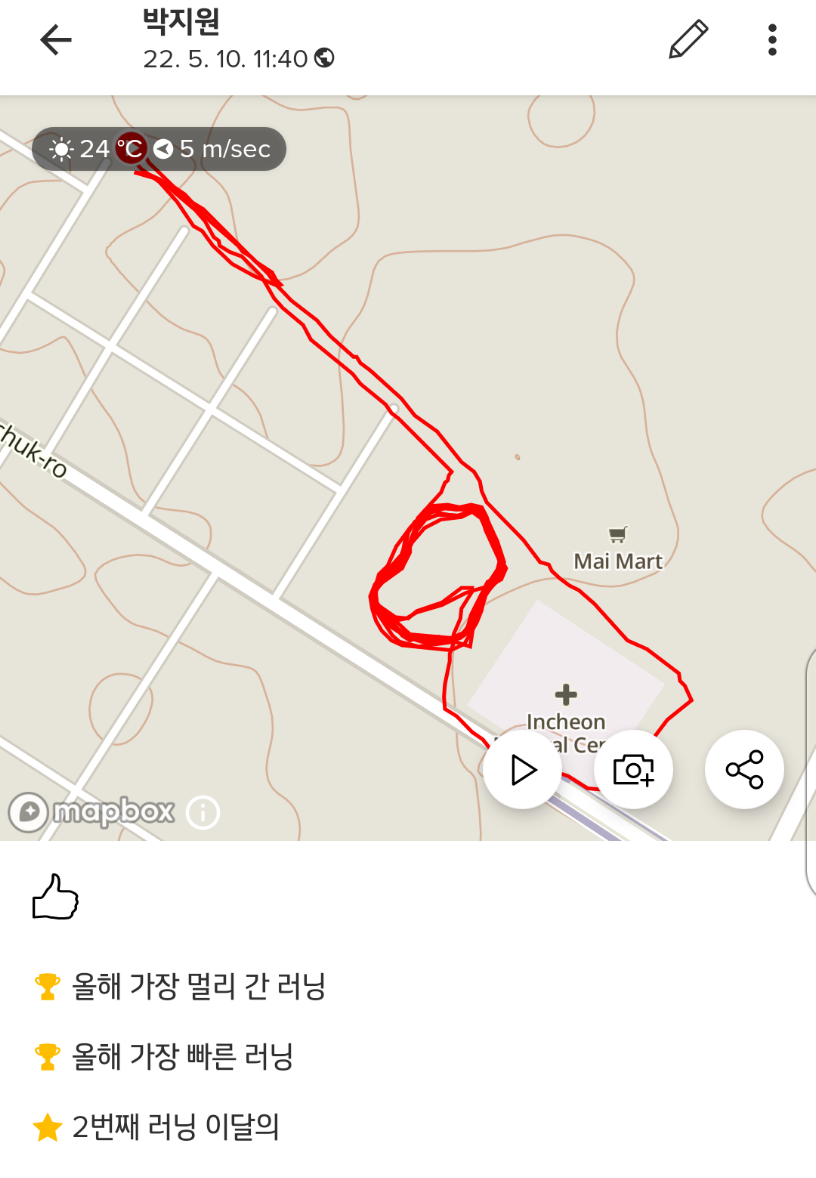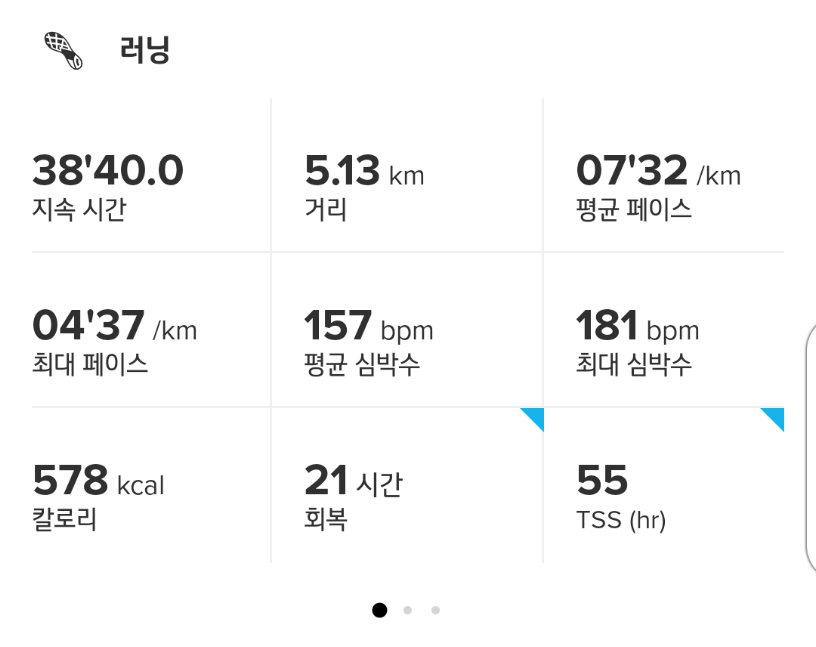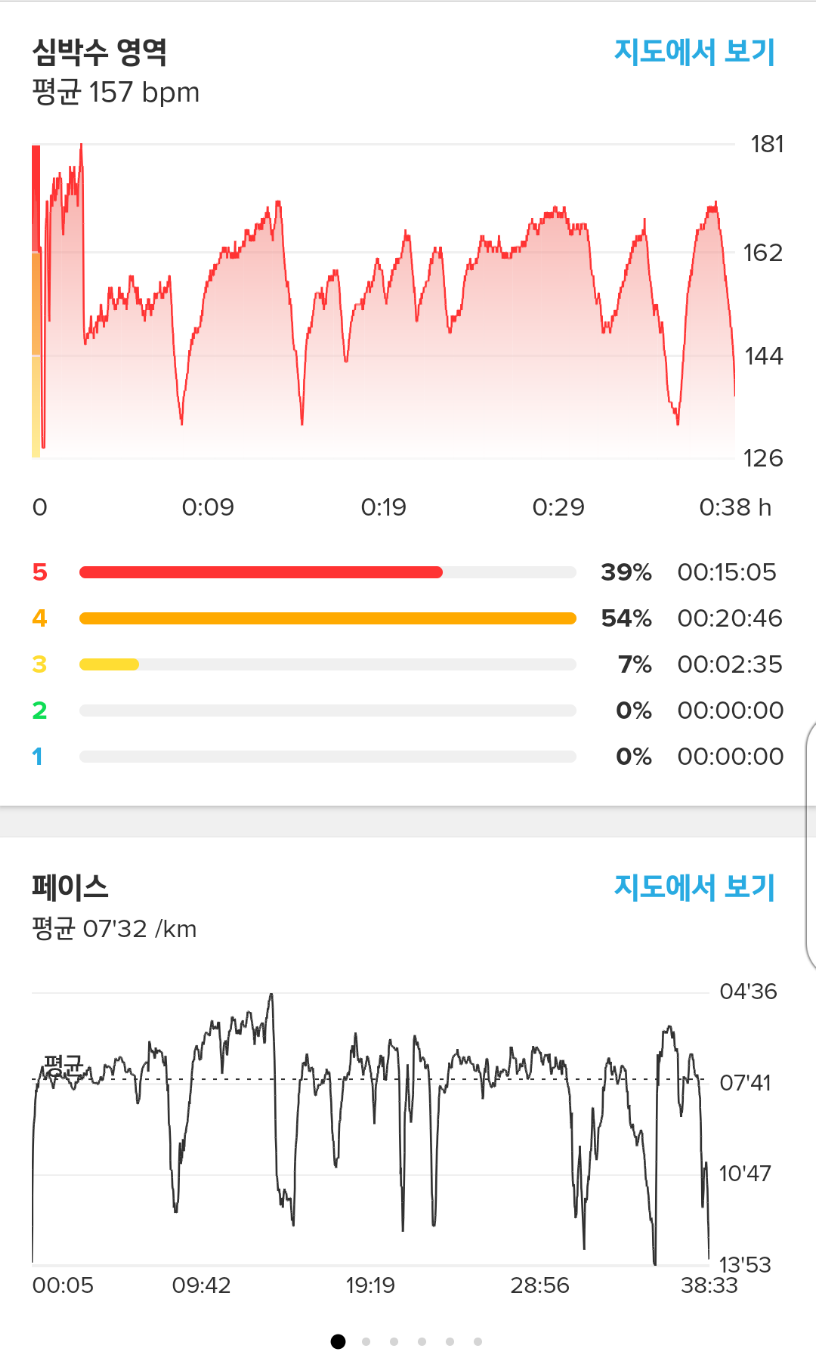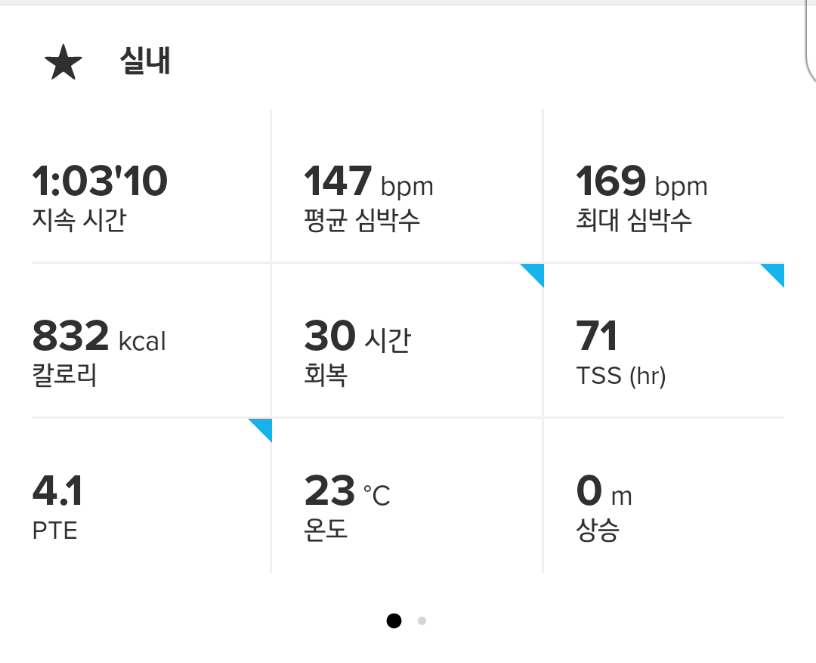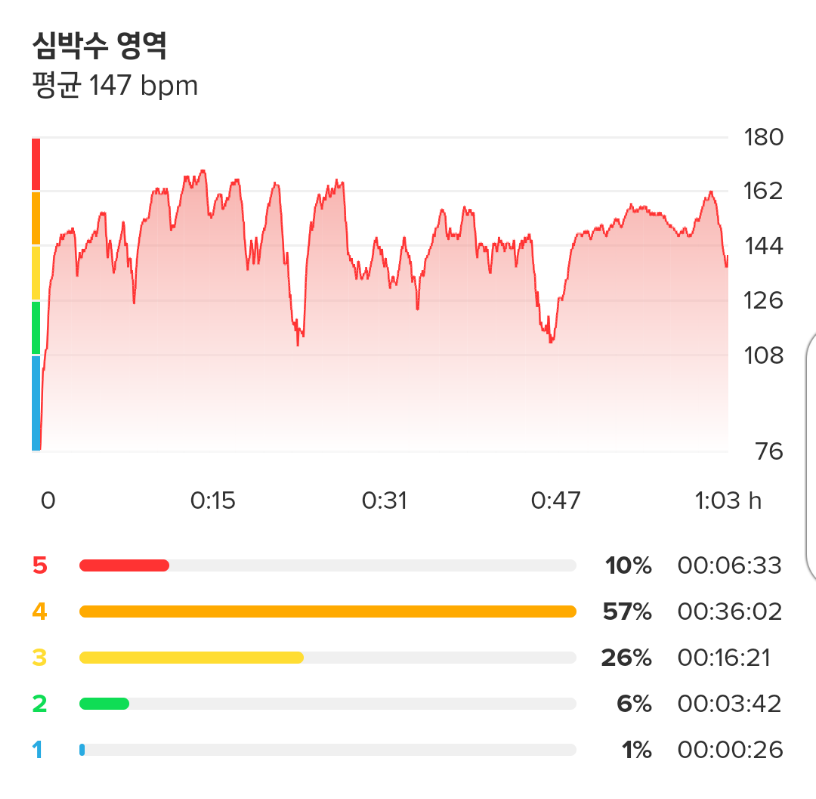에반게리온 이라는 애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할 말이 많다. 여러가지 애니들에 대해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다른 창작물 보다 좀 더 꽂혀 있다는걸 느끼게 된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많은 대표작들이 있지만, 건담이나 마크로스 같은 물건들은 동시대에서 거쳐갔다는 느낌이 적지만, 고등학교때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물건이기에 에바에 느끼는 감감성은 좀 남다르게 느껴진다.
1996년 이후 참 여러가지 말도 말고 탈도 많고 리부팅 까지 했던 그 에반게리온, 사골게리온이라고 불리는 이 만화의 최종장이라는 편이 2021년 나왔고, 어찌하다 보니 이제 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가지로 실망이다. 아무리 신극장판 이라고 해서 캐릭터들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도, 주인공들의 캐릭터 자체가 붕괴되었다고 느껴지는 장면들, 뜬금없는 커플링들. 거기다가 복잡한 레벨들을 추가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End of Evagelion(EOE)와 본질적인 이야기와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느껴진다. 이정도라면 신극장판 이런걸 다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신지라는 주인공의 캐릭터가 바뀜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볼수도 있고, 개별 캐릭터들의 행동은 바뀌었지만 결국 인류보완계획과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바뀐건 아니다. 여전히 액션씬은 대단하지만, 결론이 눈에 보이니 긴장감이 굉장히 떨어진다.
본질적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나, 나기사 카오루의 루프는 어찌보면 가장 많이 변경된, 혹은 추가된 설정일 것인데, 이 설정으로 인해 어찌보면, 에바는 또다시 끊임없지 만들어 질 수도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엑스맨 데오퓨로 인해 엑스맨이 얼마든지 리부팅 될수 있을꺼 같은 느낌. 루프물의 관점에서 바라볼때, 최종 엔딩은 많은 루프물의 클리쉐 – 중요한 무언가를 지키거나 가지기 위해서 루프를 계속하나 결국 루프를 끊기 위해선 그것을 버려야 하는 – 에 가까워 보인다. 생각나는 작품이라고 하면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통칭 마마마), 루퍼스, 나비효과, 슈타인즈게이트(성격이 좀 다르지만),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모든 세상을 기억하는 하나의 존재) 등등.
이미 사골이 되버린 에바이기에 느끼는 감성일수도 있다. 매트릭스와 마찬가지로 20세기말의 그 새로웠던 이야기는 이제 더이상 새롭지가 않고, 화려한 껍데기만 남아버렸나보다.